- 중종의 역린을 건드린 용기
- 인종과의 짧은 인연
- 문정왕후 그늘에 가린 명종
- 정조에 의한 문묘 종사
중종의 역린을 건드린 용기
하서 김인후가 조정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마주 대한 군주는 조선의 11대 왕 중종 이역李懌이었다. 세자시강원 설서로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1543년(중종 38년) 여름에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으로 승진하여 비로소 왕을 가까이서 보필할 기회를 갖게 된다. 1540년(중종 35년) 종9품 관직으로 출발해 3년 만에 종6품 관직까지 6단계나 승진한 것은 그만큼 앞날의 전망도 밝다는 의미다. 하지만 하서는 홍문관 부수찬이라는 삼사의 관료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 때 희생된 조광조 선생을 비롯한 충신들의 명예회복을 왕에게 직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림 정치의 명분에 충분히 공감했고, 조정에 들어와 현업에 종사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낀 사림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억울하게 죽었거나 귀양 간 기묘명현己卯名賢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신원伸冤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묘사화를 일으킨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제11대 왕 중종 앞에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신하는 거의 없었다. 1541년(중종 36년) 홍문관 부제학 이언적, 교리 이황 등 10여 명이 올린 이른바 ‘1강綱 9목目’의 상소에 가볍게 언급된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패기 있는 신진 관료 하서는 사림 출신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
하서는 그해 6월 홍문관 차자箚子를 올려 약 25년 전 있었던 ‘기묘사화’에 대해 논하며 기묘 명현들의 사면 복권을 간청하였다. 하서는 홍문관 부수찬 자격으로 올린 차자에서 붓을 들자마자 서두에서 군주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치국의 근원과 대본은 군주이므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군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기묘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지하의 원혼들에게 광명을 찾아주어야 함에도, 두려워 움츠린 선비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현실을 통탄해 마지않는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적었다. 끄트머리에 빠진 부분을 제외하고도 장장 2,303자에 이르는 긴 상소문이었는데, 중종이 뼈아프게 받아들였을 만한 대목을 조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문관 차자 弘文館 箚子
근년에 들어 삼신三辰(日月星)이 흉凶한 조짐을 알리는 가운데, 서리와 우레가 자주 나타나고 물난리와 가뭄이 서로 겹치며 질병조차 간간이 발생해 민생은 어렵고 국가는 피폐합니다. 더구나 새해 아침에 일식日蝕의 변變이 나타나고 동궁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늘이 후끈거리는 등 열흘 안에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어느 뉘라서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들이 알기에 사람의 일과 하늘의 도는 서로 감응한다고 하였는데, 거듭 생각해 보아도 전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전하께서는 아직도 간사한 자들이 어진 이들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려고 없는 사실을 꾸며대는 실상을 깨닫지 못하시어, 시원스럽게 뉘우친 모습을 열어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따라서 조야朝野의 사림士林이 모두 기묘년에 일어난 원통한 일을 민망히 여기면서도 본심을 털어놓고 죄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아뢰어서, 위로는 전하의 의심을 풀어드리고 아래로는 지하에 계시는 기묘 충신들의 분한 마음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선비의 꿋꿋한 기개가 무너지고 떨어진 양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弘文館 箚子
比年以來。三辰吿凶。霜雷失時。水旱相仍。疫癘間發。民生日蹙。邦國殄瘁。且況太陽之蝕。正當三朝。春宮烈火。幾及熏天。旬日之内。災厄疊見。耳目所及。孰不寒心。臣等聞。人事感於下。則天道應於上。臣等反覆思之。不識殿下之所以致此者。果何爲而然哉。
殿下欲將何所恃以爲安也。殿下尙不悟憸邪陷賢之情狀。而快開悔懊之萌。朝野士林。無不愍己卯之寃枉。而至今不能開陳本心。顯白非辜。上以釋殿下疑貳之一念。下以灑九原冥冥之忠憤。士氣之頹墮。於此亦可以見其一端矣。
중종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서는 한 달 후인 7월 20일 경연검토관으로서 왕의 수신과 인재 등용을 논하는 조강에 나가 다시 기묘년에 일어난 일을 거론하고, 기묘사화 이후 ≪소학≫과 ≪향약≫을 거들떠보지 않게 된 세태를 소상히 아뢰었다. 품계로만 보면 아직 하위직 관료에 지나지 않은 하서가 중종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한다는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이날 하서가 직접 진술한 내용 중 한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바른 선비들을 《소학》의 무리라 하여 배척하는 낡은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는 조정의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기묘년에 희생된 사람들이 한때 잘못한 일은 있더라도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죄를 입었습니다. 그 후에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비록 죽어도 남은 죄(大逆不道)가 있는 자들이 세월이 오래되어 더러는 복직된 자도 있사온데 기묘년 사람들은 오히려 상上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사오니, 신은 홀로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기묘년 사람들이 숭상하던 《소학》 ≪향약》 등은 버려지고 쓰지 아니합니다. 《소학》과 ≪향약》은 성현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비들이 시속에 빠져 읽어서는 안 될 글이라 하며 버리니 매우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중종이 차자와 진술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자, 하서는 이틀 뒤인 7월 22일 주강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했다. 이때는 특진관 이언적도 하서의 문제 제기를 거들어주었다. 이날 하서와 중종의 대화를 기록한 중종실록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1543년(중종 38년) 7월 22일 1번째 기사
왕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김인후金麟厚가 아뢰기를, “전에 조강朝講에서 신의 말소리가 작아서 분명히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지극히 황공합니다. 기묘년 사람은 한때 한 일이 죄다 옳지는 못하나,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것이 없는데도 마침내 무거운 죄를 입었습니다. 그 뒤에 죄지은 사람 중에는 대역 부도大逆不道하여 죽어도 죄가 남을 자라도 세월이 오래되어 혹 복직復職된 자가 있는데, 기묘년 사람은 오히려 상은上恩을 입지 못하니, 신은 홀로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숭상하던 《소학》≪향약鄕約》의 글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습니다. 《소학》≪향약》은 자양紫陽의 주자朱子와 남전藍田의 여씨呂氏의 글이며, 주자·여씨는 다 성현聖賢인데, 어찌 그 글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선비는 속상俗尙에 빠져서 읽어서는 안 될 글이라 하여 버리니, 더욱 온편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기묘년 사람을 아주 불궤不軌로만 논하므로, 지금까지도 이런 말은 사람들이 다 촉범觸犯이라 생각하여 꺼립니다. 그러나 신의 소견은 이러하므로 감히 아룁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저들이 마음을 쓴 것이 그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조정이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소학≫《향약》을 사람 때문에 폐기할 수는 없다.”하였다.
御晝講。 檢討官金麟厚曰: “前於朝講, 臣語音低微, 不能分明啓達, 至爲惶恐。 己卯之人, 其一時所爲之事, 雖不能盡是, 然其本心, 則無一毫欺國, 而終蒙重罪。 其後被罪之人, 雖大逆不道, 死有餘罪者, 日月已久, 則或有復職者, 而己卯之人, 尙不蒙上恩, 臣獨以爲未便。 非特此也, 其一時所尙《小學》、《鄕約》之書, 幷棄而不用。 《小學》、《鄕約》, 紫陽 朱子、藍田 呂氏之書也, 朱、呂皆聖賢之人, 豈其書不善? 而今之儒者, 溺於俗尙, 以爲不可讀之書而棄之, 尤爲未便。 不知者, 則己卯之人, 全以不軌論之, 故當今之時, 如此之言, 人皆以爲觸犯而諱之。 然臣之所見如此, 敢以啓達。” 上曰: “彼人之設心, 雖云不非, 而將有誤國之事, 故朝廷欲矯其弊而如是耳。 然《小學》、《鄕約》, 則不可以人而廢之也。”
하서가 차자와 진술을 통해 글과 말로 주장한 논리의 골격은 세 가지다. 첫째, 기묘사화 때 희생된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신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둘째, 바른 선비들을 ≪소학≫의 무리라고 배척하는 낡은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다. 셋째, 하늘이 재앙을 내려 정치를 쇄신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때는 기묘사화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야에서는 당시 일을 꺼리고 두려워하며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현실이었다. 반정으로 왕에 추대된 중종은 태생적 한계로 첫째 부인이던 단경왕후 신씨를 왕비 책봉 7일 만에 폐위시키는 등 반정공신들의 눈치를 보며 정사를 처리한 유약한 군주였다. 동시에 조광조 같은 개혁 관료를 파격적으로 발탁했다가 사약을 내리는 등 이중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자신이 아무리 신임하던 실세 측근도 눈밖에 들면 가차 없이 목을 쳤다. 1519년(중종 14년) 조광조, 1533년(중종 28년) 경빈 박씨, 1537년(중종 32년) 김안로에게 각각 사약을 내린 사례가 기억에 생생한 시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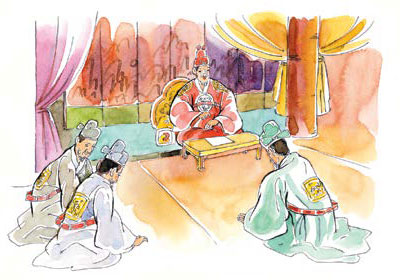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하서가 문신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기묘 명현의 신원 즉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사면 복권을 개진한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로서, 성리학에 대한 도통적 의리에서 나온 언행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림들의 입이 열려 공개 석상에서 정암 조광조의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기묘 명현이 국가를 해칠 목적은 아니었으므로 용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하서 차자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중종은 하서의 주청을 절반만 받아들였다. 먼저, 기묘명현의 신원에 대해서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처벌한 것이므로 당장 사면할 수 없다고 비답을 내렸다. 왕이 내린 답변을 비답批答이라고 한다. 다만, 기묘사화 때 금지하거나 폐기한 《소학》과 《향약》은 다시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서의 실망은 컸다. 무엇보다도 기묘명현의 신원이라는 큰 뜻을 이루지 못하자 훈구파인 반정공신들이 주도하는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 연산군 시절에 반정을 통해 왕이 된 태생적 한계로 아직도 공신의 눈치를 보는 중종이 애처롭기까지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연로하신 부모 봉양을 위해 고향 가까운 곳에 내려가 근무하고 싶다고 자청했다.이러한 일을 걸양乞養이라고 한다. 그 결과 1543년(중종 38년) 겨울에 고향 장성과 가까운 옥과玉果 현감縣監(지금의 곡성군 관내 옥과면)이라는 외직으로 나갔다. 발령이 난 현감 자리는 종6품으로 조선 시대 지방 수령 중 가장 작은 고을 원님이었다. 춘추관의 겸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얼마 안 가서 1544년(중종 39년) 11월 중종이 세상을 떠났다. 연산군의 이복동생으로 왕세자 교육 한번 받지도 않고 왕이 되었지만, 재위 기간은 40여 년을 헤아릴 만큼 길었다. 마침내 하서가 세자 때 가르치던 인종이 새로 왕위에 즉위하여 기묘년에 희생된 선비들인 조광조·김정·기준 등의 신원을 허락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를 기약하며 전국의 유능한 선비를 불러 모으고, 하서에게 왕을 위한 경연의 보도를 맡기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궐을 장악하고 있는 외척들의 발호는 왕이 바뀌어도 그치지 않았다. 이에 하서는 앞으로의 정치도 여전히 대윤과 소윤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별로 조정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다만 세자시강원 설서 시절 곁에서 보필했던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건강이 여의치 못하자 걱정이 커졌다. 그래서 왕의 환후에 대한 약을 처방하기 위한 논의에는 참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옥과 현감으로 복귀했다.
인종과의 짧은 인연
12대 왕 인종 이호李岵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아까운 왕으로 손꼽힌다. 가장 총명하고 가장 착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세 살 때 천자문을 다 외울 정도로 신동이었고, 학문의 성취도 가장 빨랐다고 전해진다. 예의 바르고 판단이 신중해 궐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 다른 왕들은 보통 10세 전후에 세자로 책봉됐는데, 인종은 6세에 세자로 책봉된 이유다. 인종은 심지어 계모가 되는 문정왕후와 그 아들인 경원대군에게도 거리감을 두지 않고 가깝게 지내려고 애썼다. 하서는 인종이 세자로 있을 때 교육을 맡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니며 좋은 인연을 맺었기에 인종의 즉위를 누구보다 반기고 새 군주에 대한 기대가 컸다. 세자에 책봉된 지 24년이나 되는 준비된 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45년 여름(7월)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대궐밖에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어 땅을 치고 슬퍼했다. 이때 인종의 나이 30세이고 인종보다 6년 연상인 하서의 나이는 36세였다. 옥과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그는 목을 놓아 통곡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났다. 몇 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인생의 분수령에서 중대한 결단을 한다.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다.
이때부터 하서는 어느 석학의 표현처럼 ‘처절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선 병을 핑계 삼아 옥과 현감을 사직했다. 그리고 고향 장성으로 돌아와 은둔한 채 한동안 술과 시로 울분을 쏟아내며 지냈다. 이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절의’를 고수하는 생활로 일관했다. 명종 즉위 후 조정에서 계속 관직을 권했으나 불의한 세력과 정사를 같이 논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그때마다 거절해 고고한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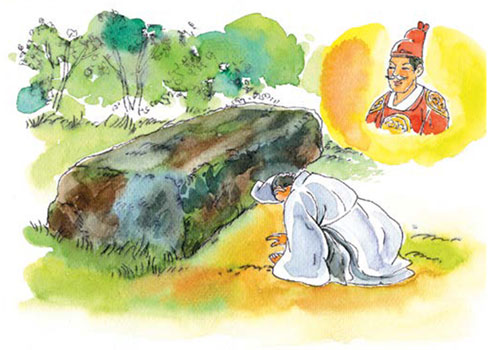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종의 생모 장경왕후는 세자 이호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다. 인종도 몸이 병약한 편이었지만 중전으로 들어온 문정왕후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 별 탈 없이 잘 자랐다. 다만 세자보다 여섯 살 더 먹은 왕자를 둔 후궁 경빈 박씨의 견제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문정왕후가 늦은 나이에 친아들을 낳자, 태도가 돌변해 세자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며 괴롭혔다. 평생 두 여인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불우한 세자였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대신들로부터 왕의 재목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들었다. 계모인 문정왕후에 대해서도 친모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 모셨다. 그런데도 문정왕후는 세자를 박대하면서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인종의 죽음 배경에는 문정왕후가 자신이 낳은 경원대군(훗날의 명종)을 왕에 앉히려고 소윤小尹의 거두 윤원형 일파와 손을 잡고 꾸민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공식적인 실록에는 “아버지 중종이 승하하자 효심이 지극한 인종이 금식하면서 상을 치르다가 몸이 쇠약해져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야사에 의하면 문정왕후가 건네준 떡을 먹고 죽었다는 미확인 독살설이 궁중은 물론 저잣거리에도 나도는 판이었다. 하서도 왕의 건강보다는 복잡한 궁중 사정이 젊은 왕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했다. 거기에다가 문정왕후 측근인 소윤 세력과 반대파인 대윤 세력 간 대립이 심화해 향후 정치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견되자 도학 정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장성으로 낙향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 ≪인종실록≫ 총서總序는 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인종의 승하
왕의 휘諱는 호峼이니 중종 대왕의 맏아들이고 모비는 장경 왕후 윤씨이다. 어릴 때부터 재지才智가 빼어나 3세에 능히 글의 뜻을 알았고 6세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성품이 매우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며 인자하고 공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실천이 독실하였으므로 동궁에 있은 지 25년 동안에 어진 덕이 널리 알려졌다.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게 되어서는 중외가 지치至治를 기대했었는데, 상중에 너무 슬퍼한 탓으로 갑자기 승하하게 되었고 또 뒤를 이을 아들도 없었으니, 애석하다. 1년간 재위하였고 수壽는 31세이다.
이로써 과거를 응시하기 위해 올라다니던 기간 9년, 관료 생활을 하던 기간 6년을 합쳐 15년간의 서울 생활은 막을 내렸다. 하서가 시끄러운 한양도성 안의 생활이 싫어서 한적한 교외인 현재의 안암동에 지었던 평천장平泉莊과도 이별하게 되었다. 자손들에게 ≪평천장기≫란 글까지 남길 정도로 각별한 정을 쏟으며 지은 서울집인데 떠나기가 아쉬웠을 것이다. 하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세가 보장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음에도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고향의 품에 안겼다.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 시를 짓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 인종이 승하한 7월 1일이면 장성 맥동 집 남쪽 난산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밤새워 곡하기를 해마다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인종에 대한 절의가 한결같은 충신이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인종이 만약 수명만 길었다면 도학 정치를 펼쳐 정사를 제일 잘 처리했을 1등 군주다. 하서가 인종과 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한이라면 한이다. 조금만 더 살고 가시지 왜 그리 일찍 떠나가셨을까 원망도 해보았다. 병약한 몸으로 작서의 변이나 동궁 화재 사건 같은 변고를 자주 겪었고, 문정왕후가 대놓고 “우리 모자는 언제 죽일거냐”고 패악질을 하는 등 피 말리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부왕인 중종의 상을 치르느라 식사도 거르면서 체력을 소진한 것이 결정적으로 명을 재촉한 원인이라고 여겼다.
하서는 인종이 세상을 떠난 을사년 이후 매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무렵이면 책을 읽거나 글 쓰는 일을 그만두고 손님도 만나지 않았다.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문밖을 걸어 나간 적이 없었다. 특히 인종의 기일인 음력 7월 초하루가 되면 집 앞 난산에 들어가 곡을 하며 밤을 지새우고 내려오기를 평생에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현재도 그 자리에 있는 통곡대 유적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하서는 또 순창으로 가서 훈몽재를 짓고 살면서 소쩍새 슬피 울고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에 인종을 그리고 애도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임 그리워/유소사有所思≫란 제목의 시를 지었다. 서른 살 인종과 서른여섯 살 하서가 서로 만난 기쁨도 다 누리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시다. 후대 인구에 회자한 유명한 시로서 하서 선생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송되는 시다.
임 그리워
임의 나이 삼십을 바라볼 때
내 나이 서른하고 여섯이었소.
신혼의 단꿈을 반도 다 못 누렸는데
시위 떠난 화살처럼 떠나간 임아.
내 마음 돌이라서 구르지 않네
세상사 흐르는 물처럼 잊혀지련만.
한창 때 해로할 임 잃어버리고 나니
눈 어둡고 이 빠지고 머리가 희었소.
묻혀서 사니 봄가을 몇 번이더냐
아직도 죽지 못해 살아 있다오.
나무로 만든 배는 강물 가운데 있고
남산엔 해마다 고사리가 돋아나누나.
도리어 부럽구려 주나라 왕비
생이별로 권이(꽃 이름)를 노래했으니.
有所思
君年方向立 我年欲三紀
新歡未渠央 一別如絃矢
我心不可轉 世事東流水
盛年失偕老 目昏衰髮齒
泥泯幾春秋 至今猶未死
柏舟在中河 南山薇作止
却羨周王妃 生離歌卷耳
이 시는 훗날 일제강점기 시절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발표한 ≪님의 침묵≫에 비견된다. 만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이 이성異性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을 가리키듯이, 하서의 ≪임 그리워≫에 나오는 ‘임’도 일찍 승하한 자연인 인종을 지목한다기보다는 그 인종이 구현해보지 못하고 떠난 도학 정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서가 인종의 죽음을 애도한 또 다른 글로는 ‘조신생사’가 있다. ‘조신생사’는 신생을 조문하는 글이라는 뜻이다. 신생은 중국 진나라 헌공의 태자였는데, 자신의 아들 해제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여희의 모함을 받아 죽었다. 김인후는 모함을 받은 신생의 죽음과 갑작스러운 인종의 죽음을 연결하는 의도에서 이 조사를 지은 것이다.
문정왕후 그늘에 가린 명종
1545년 명종 이환李峘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다. 왕대비인 문정왕후는 왕이 1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청정에 들어갔다. 그것도 편전까지 나와 왕과의 사이에 쳐진 발 즉, 수렴 뒤에서 일일이 국정에 간여했다. 명종에 앞서 성종 때 수렴청정을 한 정희왕후는 대비 궁에서 나오지 않고 내관을 통해 명령을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사에 간여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문자를 알고 유교적 지식까지 쌓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골적인 개입을 한 것이다. 심지어 왕과 대신들의 경연 석상에도 참석했다. 가히 여자 군주로 불릴 만한 왕대비였다. 조정 내외에서 염려한 대로 문정왕후는 왕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를 어지럽혔다. 먼저 명종 즉위 원년에 4대 사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을사사화를 일으켜 반대파를 제거했다. 문정왕후의 밀지에 따라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이 나섰다. 사림파 선비로서 선왕인 인종 편에 섰던 윤임 등 대윤 계열 인사 40여 명을 역모죄로 몰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조선 왕조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문정왕후와 측근들의 은밀한 소통이 이를 대신했다. 퇴계 이황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43세의 나이에 고향으로 낙향에 도산서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한다. 1547년(명종 2년)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했다. ‘위로는 여주女主, 아래에는 간신 이기李芑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익명의 벽서가 나돈 것이다. 여기서 여주란 ‘여자 군주’ 즉 문정왕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를 계기로 얼마 남지 않은 대윤 세력이 소윤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들은 하서의 사상적 동지요 절친한 벗들이었다. 하서가 옥과 현감일 때 교분을 맺은 전라도 관찰사 송인수에겐 사약이 내려지고, 하서의 사돈이 되는 미암 유희춘도 유배됐다. 정미사화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며 하서는 문정왕후 측근 세력의 간사함과 잔악함에 몸서리를 쳤다. 정미사화는 성격상 을사사화의 속편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문정왕후는 또 유생과 관료들의 이어지는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승려와 환관을 가까이 두고 국정을 농단했다. 전국적으로 화려한 왕실 사찰을 건립하고 수많은 불화를 제작하느라 나라의 재정을 거덜 냈다.
13대 왕 명종의 재위 기간 22년 중 8년에 이르는 수렴청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실세 권력자로서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친동생인 윤원로마저 유배를 보낸 뒤 사약을 내린다. 하지만 또 다른 동생 윤원형은 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올라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는 임꺽정이 황해도 지방에 나타난 것도 명종 시대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들을 도적 떼로 몰고 갔지만, 사익을 채우기 위해 가렴주구를 일삼는 위정자에 대한 백성의 저항이라고 보아야 옳다. 기록에 의하면 명종은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이후 비교적 선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정왕후 측근이었던 승려 보우의 승직 박탈과 유배, 윤원형의 관직 삭탈을 과감히 단행했다. 경국대전 주해를 간행하고 조세제도의 개혁에도 힘썼다. 특히 1555년 을묘왜변 당시 전라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고 이를 계기로 비변사를 상설 기구화했다. 하지만 34세의 젊은 나이로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 조선 왕조 최초로 방계에서 다음 대를 이을 왕이 나오니 그가 바로 선조이다.

하서의 됨됨이를 엿볼 수 있는 일화로 인종 승하 후 조정의 부름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하서는 낙향 후 조정에서 끊임없이 임명한 관직을 정면 거절하거나 응하는 척하다가 병을 핑계로 거절하는 일을 반복했다. 명종이 즉위한 뒤 몇 차례 벼슬을 제수했으나 하서는 즉시 병을 이유로 고사한다. 그리고 1546년(명종 원년) 6월에 ≪효경간오≫ 발문을 짓는 등 학문 연구에 진력한다. 무릇 학문의 본질은 지식에 있지 않고 실행에 있다는 사실을 하서는 몸소 보여줬다. 관직보다 인간적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하서는 1547년(명종 2년) 봄에 성균관 전적으로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가을에는 또 공조정랑으로 제수되어 부름을 받고 길을 가다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전라도사에도 제수되었으나 바로 교체되었다. 1553년(명종 8년) 7월에 성균관 전적에 재차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해 9월에는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되었다. 하는 수 없이 부름에 응하여 길에 올랐다가 병이 났다고 글을 올려 사직을 청하고 돌아왔다. 이어서 11월에 성균관 직강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위중하여 견디기 어려운 실정을 간절하게 아뢰며 나아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554년(명종 9년) 늦가을 9월 성균관 직강에 또 임명되었으나 글을 올려 사양하였다. 그러자 10월에 명종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음식을 내려보내도록 하고, 병이 낫거든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라.”고 특명을 내렸지만, 글을 올려 사양했다.
이처럼 하서는 10년 넘게 조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난 인종에 대한 절의도 절의지만,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우려에서다. 한때 조정에 몸담았던 선비로서 구조적 병폐가 발생하고야 말 저 흙탕물 같은 권력 놀음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왕조실록이 그대로 전한다. 명종실록 19권 1555년(명종 10년) 11월 7일 2번째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명종실록 1555년 11월 7일 기사
참찬관 박민헌이 이황과 김인후를 부를 것을 아뢰다.
상上이 야대에 나아갔다. 참찬관 박민헌朴民獻이 아뢰었다.
“경연관 중에 신과 같은 자는 글의 뜻을 모르니, 진강進講할 때 비록 성심誠心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움되는 바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유자儒者를 구하여 조석朝夕으로 그와 함께 강론講論하시면 도리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황李滉은 고인古人의 글을 많이 읽고 학문에 힘쓴 사람으로 몸에 병이 있어 산림山林을 좋아하고 세무世務에 오활하여 치생治生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올라오게 하더라도 머물면서 벼슬살이하기를 어렵게 여겨 곧 도로 퇴거居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약 육조六曹의 참의參議로 삼는다면 진현進見할 기회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마음속의 회포를 펼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육조의 참의도 특진관으로 삼았었으니, 이런 사람을 특진관으로 삼아 경연에 으레 참여하게 하여 논사論思하게 한다면 도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인후金麟厚는【*김인후는 재행才行이 있고 영진榮進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김인후는 독서讀書하기를 좋아하였고 글을 잘 지었으며,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담담하였다. 만년晩年에는 성리학性理學을 좋아하여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였다. 여러 번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오직 독서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만약 경연의 자리에 참석시킨다면 틀림없이 돕고 인도하는 공功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불렀으나 병이 많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으니, 억지로라도 올라오게 하면 비록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진현하고 강론할 때에 어찌 보탬이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사신은 논한다. 유신儒臣으로 이황·김인후 같은 이가 있었으나, 발탁하여 등용해서 논사論思하는 위치에 두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시골로 퇴거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크게 잘못된 정사政事가 아니겠는가. 박민헌이 참찬관이 되니 돕는 바가 많았으나 말은 채택되지 않고 몸도 중임重任에서 외무外務인 천문天文으로 체직되었으니, 오늘날의 정사가 어찌 그리 경중의 차례를 잃었는가?
明宗實錄 1555年 11月 7日
上御夜對。 參贊官朴民獻曰: “經筵官如臣輩, 不知書義, 於進講之際, 雖有誠心, 而顧無所裨益也。 須求儒者, 朝夕與之講論, 則可以知道理矣。 李滉之爲人, 多讀古人書, 而力學者也。 身有疾病, 性癖山林, 闊於世務, 不能治生, 故雖使上來, 而留仕爲難, 旋復退居。 如此之人, 若爲六曹參議, 則無進見之時, 安能展其胸懷乎? 古者六曹參議, 亦爲持進官。 此人若爲特進官, 例參於經席而論思, 則裨益弘多矣。 且金麟厚 [有才行, 不以榮進爲心。 麟厚好讀書, 善屬文, 敝裘蔬食, 淡如也。 晩喜性理之學, 硏精覃思。 屢徵不起。] 之爲人, 唯以讀書爲事。 若參於經席, 則必有輔導之功矣, 以其多病, 故屢召不就。 强令上來, 則雖不久留, 其於進見講論之時, 豈無裨益之事乎,”
[史臣曰: “有儒臣如李滉、金麟厚, 而不爲擢用, 以置論思之地, 使之退居田野, 豈非闕政之大者乎? 民獻爲參贊官, 多所裨益, 而言不見採, 身亦以天文外務, 而遞此重任, 今之爲政, 何其失輕重之序耶。”]
당시 조정이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록이다. 퇴계와 하서를 경연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참찬관의 진언이나 이들을 발탁 등용해서 가까이 두지 않고 시골에 머무르게 한 것은 크게 잘못된 정사라는 사관의 지적이 쩌렁쩌렁한 울림을 준다. 이렇게 조정이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서는 점차 은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 다음 시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산속의 사철 경치를 읊다 詠山中四景
인간 세상일이라면 귀를 씻으니
번성 쇠퇴 어느 것도 나는 모르네.
솔꽃 향기 여기저기 흩날리고
구름 그림자 느릿느릿 따사로웠지.
낙엽 소린 바람 부는 밤에 들리고
차가운 매화는 눈 내릴 무렵 보았지.
쓸쓸한 가운데서 참다운 흥이 있으니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러겠지.
정조에 의한 문묘 종사

문묘 제도 개요
앞서 살펴본 중종, 인종, 명종은 하서가 살아 있으면서 직접 만나 소통한 왕들이었다. 이에 비해 정조는 하서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40여 년 만에 문묘 종사를 계기로 간접적으로 소통한 군주다. 하지만 역사상 하서 김인후의 됨됨이를 가장 높이 평가한 이가 바로 조선의 22대 왕 정조 이산李祘이었다. 정조는 하서 선생을 문묘에 배향해 ‘동국 18현’의 한 사람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문정文正’의 시호를 하사하고 영의정에 추증했으며 영원히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불천위不遷位’의 영예를 안겼다. 정조는 선생을 도학 연원의 정통을 이어받은 유학의 종장으로 추앙했다.
문묘文廟는 문선왕묘文宣王廟의 약자로 공자의 신위를 받드는 공자묘孔子廟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묘廟는 무덤 묘墓가 아니라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사당祠堂을 뜻하며, 동아시아 전반에 분포해 있다. 문묘의 대성전에는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여 4성四聖을 배향配享하고, 공문 10철哲 및 송조 6현賢과 우리나라의 신라·고려·조선 시대의 동방 18현을 종사從祀 하였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제례 의식인 석전제釋奠祭를 거행하고 있다.
문묘의 연혁을 살펴보먼 고려 시대인 1020년 (현종 11년) 신라의 유학자 최치원을 문묘 종사하고, 1022년 (현종 13년) 역시 신라의 유학자인 설총을 문묘 종사하였다. 1407년 (태종 7년) 한양에 현재의 성균관 문묘가 완성되어 대성전에 공자 신위를 정위에 봉안하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 4성을 배향하였다. 그 밑의 공문 10철(공자 문하의 안회·민자건·염백우·중궁·재아·자공·염유·자로·자유·자하를 말함)을 종사 함으로써 유학의 큰 도통이 정리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 세력들은 세조와 연산군 시대를 거치면서 자의적으로 행사된 왕권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이상적인 이념을 문묘 종사라 생각하고 4현四賢(정몽주,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의 문묘 종사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이후 이황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포함한 5현五賢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1517년(중종 12년) 정몽주의 종사가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때 병화로 소실되었으나, 1604년(선조 37년) 중건을 계기로 5현五賢의 종사가 다시 논의되었으나, 선조는 이언적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성균관의 유생 및 지방의 유생들도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예조, 대간, 대신들도 그 의견에 동조하여 1610년(광해군 2년)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이른바 5현五賢의 문묘 종사가 이루어졌다. 이이·성혼 등의 종사 때에는 서인·남인 간의 학맥과 현실 정치가 연결되어 1681년(숙종 7년) 문묘 종사되었으나,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출향되었다가,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 때 복향되었다. 김장생도 1688년(숙종 14년)에 종사 되었으나 이듬해 기사환국으로 출향되었다가 1717년(숙종 43년)에 복향되었다. 송시열·박세채 등의 종사 때에도 노론과 소론·남인의 대립으로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송시열·송준길은 1756년(영조 32년)에, 박세채는 1764년(영조 40년)에 문묘 종사가 이루어졌다. 김인후의 종사는 1796년(정조 20년)에 이루어지는데, 그의 당색은 따질 수 없으며 호남 제일의 유현으로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호남 학파를 끌어안는 효과를 가져왔다. 조헌·김집의 종사는 영조 때부터 노론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논의되었으나, 1883년(고종 20년)에 이루어졌다. 현재 성균관 및 각 지방의 향교 대성전에는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여 4성四聖을 배향하고, 공문10철 및 송조 6현賢(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과 우리나라 동방 18현의 신위를 종사하여 매년 춘추 향사하고 있다.
문묘종사의 의의와 평가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므로 문묘 종사의 기준은 당연히 공자의 도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얼마만큼 공헌했느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문묘 종사는 대부분 도학道學의 실천과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선비만이 당당히 공자의 옆자리에 종사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와 같이 역사가 선택한 동방 18현인은 권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문이 좋다거나, 벼슬이 높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벼슬과 출세를 마다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역사책에서조차 흘려버리는 당대 석학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유명하냐가 아니다. 모두 나름대로 독창적인 자신의 학문 세계를 구축하고, 학자와 선비로서 양심과 도덕을 실천했느냐이다. 따라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학자로서 후세에 존경을 받고, 학문적 업적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크고 높아야 선정되었다. 문묘는 공자와 4성을 비롯한 공문 10철 및 송조 6현과 우리나라의 신라·고려·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에서 공인한 최고의 정신적 지주에 오른 동방 18현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문묘 종사는 유학자로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상이며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이다. 따라서 정공신이나 종묘 배향 공신들보다 더 높은 명예를 누렸으며, 만인의 칭송을 받는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다. 옛말에 “정승 3명이 죽은 대제학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대제학 3명이 문묘배향 현인 1명에 미치지 못한다. “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리하여 문묘 배향 현인을 배출한 각 가문은 그 어느 권문세가를 뛰어넘는 국반國班으로서 대대손손 더 없는 영예로 알았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문묘 종사 인물을 정하는 일은 학통·당파·정치 정세 등에 따라 당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출향되거나 복향되기도 하였으며,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반드시 중국의 예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정몽주는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섬겼다는 이유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의심 받았다. 선조와 광해군 연간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5현의 종사시에 김굉필은 절조와 경학이 뛰어났으나 짧은 생을 살다 죽어 성경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였다는 훈구파의 격렬한 반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언적도 을사사화 때 처신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출처에 대해 의심을 받았고, 이황 또한 소년 시절 행적이 들춰졌다. 이이는 한때 불교에 몸담았던 전력 때문에 학문의 순정성을 의심받았고, 성혼은 기축옥사와 임진왜란 때의 처신 때문에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둘의 위패가 문묘에서 출향되었다가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 때 복향 되었다. 조선 시대의 문묘 종사가 도학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문이나 진리의 문제를 넘어 정치의 문제였고 권력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묘 종사만큼 학문과 권력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장생은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될 때 출향되었다가 1717년(숙종 43년)에 다시 종향되었으며, 영조 때의 송시열·박세채의 종사 때에도 많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또한 성리학 외에 노장사상이나 양명학 등 이단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인물들은 철저히 배격됐다. 서경덕이 그 대표적 예였다. 그리하여 문묘 종사에 있어서 자격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비교적 자유스러웠던 인물들은 김인후 등 몇몇 학자뿐이었다. 이와 같은 문묘 종사는 단순히 선현에 대한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붕당의 명분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학문적인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동방 18현
- 동배향 제1위: 홍유후(弘儒侯) 설총 서배향 제1위: 문창후(文昌侯) 최치원
- 동배향 제2위: 문성공(文成公) 안유 서배향 제2위: 문충공(文忠公) 정몽주
- 동배향 제3위: 문경공(文敬公) 김굉필 서배향 제3위: 문헌공(文憲公) 정여창
- 동배향 제4위: 문정공(文正公) 조광조 서배향 제4위: 문원공(文元公) 이언적
- 동배향 제5위: 문순공(文純公) 이황 서배향 제5위: 문정공(文正公) 김인후
- 동배향 제6위: 문성공(文成公) 이이 서배향 제6위: 문간공(文簡公) 성혼
- 동배향 제7위: 문원공(文元公) 김장생 서배향 제7위: 문열공(文烈公) 조헌
- 동배향 제8위: 문경공(文敬公) 김집 서배향 제8위: 문정공(文正公) 송시열
- 동배향 제9위: 문정공(文正公) 송준길 서배향 제9위: 문순공(文純公) 박세채
하서의 문묘 종사 경위
하서는 조선 중기 중종 5년에 태어나 명종 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기는 연산군의 혼란된 조정을 중종반정으로 바로 잡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던 과도기였다. 중종 초기 새롭게 문치의 기운을 열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중종의 등극과 함께 신비를 폐출하면서부터 내부적으로는 외척 세력 간 다툼이 치열하고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 노골화되었던 시대였다. 이때 일어난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는 이러한 시대적 성격을 잘 대변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기묘사화는 중종반정 후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려 했던 사림의 이상과 훈구 대신들의 현실적 욕구가 서로 부딪치게 되어 사림이 화를 입게 된 사건이고, 을사사화는 윤원형을 비롯한 명종의 외척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인종의 근신들을 해친 사건이었다. 하서는 정신적으로는 사림 사상을 계승한 도학자로서 복재 기준의 사랑을 받고, 모재 김안국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신재 최산두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는 인종의 신하였기에 대윤(윤임)이나 소윤(윤원형) 어느 편에도 가까이하지 않았고, 불의한 집권 세력들과 같은 조정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과의 연속된 싸움이었다.
그러나 인종과는 남다른 깊은 정을 나누며 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같았다. 세자와 신하의 관계로서 만 아니라 세자의 보호자로서 유일한 벗이 되어 주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인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입지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하서로서는 불우한 시대를 만나 그 높고 깊은 경륜을 펼칠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하서는 높은 인격과 학문적 경륜과 치세의 뜻을 지녔으면서도 그 이상을 펼쳐보지 못한 채 시와 술을 벗 삼고 세월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생을 보내야 했다.
이런 탓에 하서는 문하에 걸출한 제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했고, 그 자신도 능력에 걸맞게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를 위한 문묘 종사 논의도 영조 47년(1771년)에 시작되어 정조 20년(1796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됐지만, 당시 집권층인 노론 세력이 성사시키고자 했던 문묘 종사 대상자는 조헌趙憲과 김집金集이었다. 반면에 노론에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조는 김인후가 문묘 종사 대상자에서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정조는 5현(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뒤에 문묘에 종사된 인물들이 살아 있다면 김인후에게 문묘 종사를 양보했을 것이라며 하서의 문묘 종사를 고집했다. 정조가 말한 5현 뒤에 문묘에 종사된 인물들이란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이었다. 조선 후기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정조는 우여곡절 끝에 노론의 주장을 물리치고 김인후의 문묘 종사만을 허용했다. 그리고 김인후의 위패를 율곡 이이의 위패 앞에 배치하도록 결정했다. 김인후의 문묘 종사 성사는 정조가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노론 권력과 벌인 경쟁에서 왕권이 승리한 결과였다.
- 1771년(영조47년)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이 상소하여 문묘文廟 종향從享을 청하였다.
- 1786년(정조10년) 8월 팔도 유생 ‘박영원朴盈源’ 등, 10월 팔도 유생 ‘정헌鄭櫶’ 등이 소청하였다.
- 1789년(정조13년) 4월 팔도 유생 ‘심익현沈翼賢’ 등, 8월 팔도 유생 ‘신광례申光禮’ 등이 소청하였다.
- 1790년(정조14년) 3월 팔도 유생 ‘이악겸李岳謙’ 등이 소청하였다.
- 1796년(정조20년) 6월 팔도 유생 ‘이명채李明彩’ 등, 방외方外 유생 ‘김무순金懋淳’등, 가을 7월 경기・호서・호남 삼도의 유생 ‘이종호李種祜’등, 팔도 유생 ‘채홍신蔡弘臣’ 등, 8월 경외京外 유생 ‘정대현鄭大賢’등・경외京外 유생 ‘이규남李奎南’등, 9월 관학 유생 ‘심내영沈來永’ 등・관학 유생 ‘이광헌李光憲’ 등이 등이 소청하였다.
- 1796년(정조20년)
9월17일 관학 유생 ‘홍준원洪準源’ 등이 문묘 종사를 청하자, 정조대왕은 선정이신 김인후는 우리 동방의 주자周子요, 도학 연원의 정통으로 유학의 종장宗匠이라 할 수 있다며 윤허하였다. - 1796년(정조20년)
11월8일 예관을 보내어 문선왕묘文宣王廟에 술잔을 올린 후, 문묘 종사 의식을 행하고 교서를 선포하였다.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다음과 같은 정조의 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에도 명쾌하게 나타나 있다. 몇 대목만 소개한다.
문묘종사교서 文廟從祀敎書
경卿은 해동의 염계濂溪이자 호남湖南의 공자이다. 성명性命과 음양陰陽에 관한 깊은 식견은 아득히 태극도太極圖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고, 격물 치지格物致知와 성의 정심誠意正心의 요지는 먼저 《소학》에 힘을 쏟았다. 시를 지어 뜻을 말하는 데에 있어서는 천지 사이에서 두 사람만을 추대하였고, 이치를 연구하고 근원을 탐색하여 일찍이 《역상편易象篇》을 저술하였는데 여러 학설들이 탁월하였다. 홀로 대의大意를 보아 추구해 나감에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으니, 도道와 기氣가 하나로 섞여 있다고 주장한 여러 학자들의 잘못된 논리를 단연코 내쳤고, 이理와 기氣의 사단 칠정四端七情에 관한 변론은 동지들의 의심을 후련하게 풀어 주었다. 내면에 쌓인 강건하고 곧고 단정한 성품은 엄동설한의 송백松栢이었고, 밖으로 드러난 빛나고 온화하고 순수한 자태는 맑은 물 위의 연꽃이었다.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삼대三代의 인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 다행히 크게 해보고자 하던 효릉孝陵 시대를 만나 순수한 유신儒臣이 내면에 지닌 아름다운 덕을 펼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 동궁이 깊이 신임하여 이미 그림에다 뜻을 담아서 주었고, 숙직하는 관서로 찾아와서 강론하는 이외에 특별히 마음을 털어놓곤 했었다. 보필하는 신하로서 은연중에 마음이 부합한 것은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얻은 것과도 같았고, 임금과 백성들에 관한 책임을 스스로 맡고 나선 것은 이윤伊尹이 성탕成湯을 만난 것과도 같았다.
文廟從祀敎書
惟卿, 海東濂溪, 湖南洙泗。 性命陰陽之奧, 沕乎《太極圖》同歸; 格致誠正之要, 先於《小學》書着力。 賦詩言志, 獨推天地間二人; 玩理窮源, 嘗著《易象篇》諸說。 卓然獨見大意, 求之自有餘師。 道器混一之論, 斷然黜諸家之謬; 理氣四七之辨, 沛乎釋同志之疑。 剛毅直方之蘊于中, 則大冬松柏; 光明溫粹之發於外, 則淸水芙蓉。 綽乎九分地頭, 展也三代人物。 幸値孝陵大有爲之際, 佇見醇儒展所蘊之休。 受知邸宮, 固已盡圖中寓意; 賜臨直署, 別是講論外輸心。 鹽梅之契暗符, 若殷宗之得傅說; 君民之責自任, 類伊尹之遇成湯。(근거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원문 보기)
이렇게 하서 선생은 사후 236년 만인 1796년(정조 20년) 문묘에 배향되었다. 당시에 정조는 “문정文靖(하서선생의 처음 시호, 뒤에 문정文正으로 고침)의 도학 연원의 바름은 실로 으뜸가는 스승이 된다. 나는 선정 문정공이 위로는 정자, 주자가 창명한 서업을 규지하고 아래로는 문순(퇴계) 문성(율곡)이 개발한 공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극찬하였다. 이 때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 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겸 영경연사領經筵事, 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 등이 추증됐다. 동시에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영구히 사당에 모셔 제사 지내게 하는 불천위不遷位의 명命이 내려졌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조선시대 문신계 최고관인 정1품 상上의 품계명이다. 의정부는 백관의 통솔과 서정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으로 구성됐다. 영경연사는 경연관 중 가장 높은 관직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직했다. 영홍문관사는 홍문관의 으뜸 벼슬인 정1품 관직, 영예문관사는 예문관의 으뜸 벼슬인 정1품 관직, 영춘추관사는 춘추관에 두던 정1품 관직, 영관상감사는 관상감에 두던 정1품 관직으로 각각 영의정이 겸직했다. 말하자면 영의정을 맡게 되면 당연히 따라 오는 관직이다.

